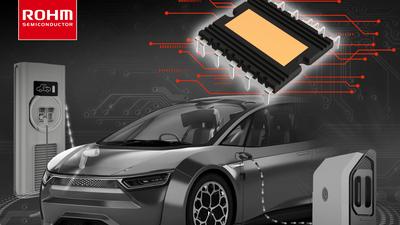<9> 외산과의 전투 대단원
1987년 2월. TDX-1을 재설계한 1만240회선 용량 양산기(TDX-1A) 19만 회선을 전국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TDX기술은 해외에 알려지고 114안내용 자동호분배기(TDX-ACD), 집단교환기(TDX-CPS), 국가행정통신망, 대용량 무선호출기(TDX-PS)의 핵심기술이 됐다.
사업단은 91년을 목표로 10만회선 용량 TDX-10 개발을 건의했다. 교환기는 한대라도 들어가면 그 지역엔 다른 기종은 들어가기 어려워 91년 전에 외국교환기가 들어가면 TDX-10이 개발돼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중용량(2만3000회선) TDX-1B를 개발해 중소도시를 지키기로 했다.
아날로그방식을 계속 구매하라던 업체들이 TDX의 약진에 놀랐는지 S1240(벨기에)과 5ESS(미국)를 도입하기 위해 시험평가를 요청했다. 사업단은 벨기에와 미국에 평가팀을 파견했다. 돌아온 팀을 기종을 바꾸어 평가하도록 배치했다. 모두 어리둥절했다. 익숙해진 기종, 친해진 업체에 매이지 않고, 기종을 바꾸어 평가하다 보니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소신껏 결함을 잡아내니 한국의 협상력이 강화됐다.
TDX-1B를 개발할 때 얘기다. 오전에 업체들을 불러 진도가 느리다 독촉하고 오후엔 서두르다 품질을 저하시켰다고 책망했다. 오전 오후로 말이 다르니 업체들은 물론 TDX사업단과 품질보증단도 변덕스럽다는 눈치다. 오전엔 사업단장이고 오후엔 품질보증단장이라고 일러 주었다. 자동차 가스페달과 브레이크는 반대 기능인데 한발로 번갈아 조작한다. 이것을 변덕스럽다고 하느냐 반문했다. 업체들은 알아듣고 품질보증팀을 따로 두고 TDX-1B개발에 정진했다.
88년 말에 TDX-1B는 개발이 끝났다. 32비트 프로세서를 내장했다는 점에서 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연구소가 개발한 TDX는 100만 회선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업체들이 역할을 분담해 개발한 TDX-1B를 양산했다. 물량도 개발기여도에 따라 배정했다. TDX-1B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중소도시를 외국교환기가 휩쓸었을 것이고, TDX-10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대도시에 외국교환기가 무혈입성해서 정보통신기술 자립의 꿈은 일장춘몽이 됐을 것이다.
TDX사업은 연구소와 업체들이 상호 보완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했다. 연구소는 교환기 운용체계(OS) 개발에서는 제구실을 했다. 업체들도 연구개발, 품질보증, 환경시험, 소프트웨어 신뢰성 면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했다.
84년에 시작한 KTA생활 만 7년. TDX사업을 관리하면서 전화국사, 접지, 동도(洞道), 맨홀, 선로 등의 설계, 공사까지 관여했다. 낙뢰로 전화국이 마비되면 현장으로 달려갔고, 일점(One point) 접지방식으로 공법을 혁신해 낙뢰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현장제일주의로 사업을 관리했다. 연구개발, 생산, 운용 현장을 누비며, 집에 있을 때나 해외 출장 중에도 통화품질을 확인할 겸 전화로 현장을 점검하고 독려했다.
TDX-10은 내가 떠난 후 상용화됐다. TDX가 창출한 비용절감, 운용안정, 국위선양 효과는 엄청나다. 회고컨대, TDX사업은 우리 정보통신기술을 선진화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혁신하는 전쟁이었다. 이 영예로운 전쟁에 함께 참여한 전우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juseo@kita.net
사진; 1989년 4월 경북 경산에서 필자(오른쪽)가 TDX-1B 중용량기 개통을 기념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