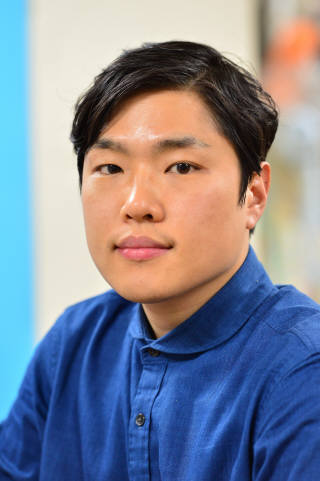
“가장 걱정되는 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걸리는 논의인데 중간에 흐지부지된 채로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되는 것이죠.”
한 대학교수 말이다. 이 교수는 의사도 게임업계 사람도 아니지만 게임 이용장애 질병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싶다는 것이 이유다. 그는 협의체를 이끌고 갈 동력으로 '투명성'을 강조했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 등재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찬반을 주장하는 양쪽 전문가가 모였다.
민관협의체는 출범 직전까지 구성원을 가렸다. 참석자조차 상대방을 당일에야 알 정도였다. 부처 간 갈등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압박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정부 관계자를 짓눌렀다. 민관협의체 구성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뤄졌다. 사안을 두고 찬반 양쪽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고 언론 관심도 지대하니 이해할 만하다.
이제 민관협의체가 출범한 이상 정기적으로, 규격을 갖춰 논의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참석자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기록해 원하는 사람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참석자도 본인 말과 주장이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게임 이용장애 질병화 논의는 “게임을 많이 하면 뇌가 망가진다” 혹은 “게임산업이 완전히 망할 것” 정도의 과격한 이야기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기존 대립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요한 역할에 걸맞은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번 협의체 의미는 단순히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을 넘는다. 사회 갈등을 민간과 정부 전문가가 모여 슬기롭게 해결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화는 찬반 양쪽 주장이 강하게 부딪히지만 어쨌든 수년 내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과정과 결론 모두 투명해야 한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