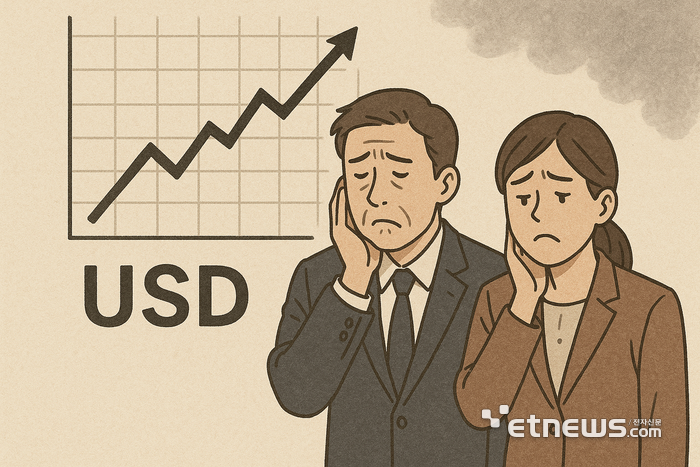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을 거듭하면서 국내 식품·유통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식품업계는 원재료 수입 등 비용 증가, 유통업계는 가격 경쟁력 약화,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를 걱정하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내년도 사업 전략 수립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4.7원 내린 1472.4원을 기록했다.
최근 1400원대를 넘어 1500원대를 넘보는 고환율 기조는 상품을 제조하는 식품업계에 부담이다. 달러로 결제하는 해외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고환율은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고환율 시기에는 원재료 가격 뿐 아니라 물류비까지 높아져 고민이 커진다.
원두를 100% 수입산에 의존하는 커피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특히 스타벅스 등 볶은 원두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품질 관리를 위해 매입 주기가 월 단위로 짧다. 연 단위로 생두를 수입하는 업체들보다 환율 영향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계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달러화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면세점의 경우 고환율이 지속되면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면세점 상품이 백화점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면세업계는 이달 초 국내 브랜드 제품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 환율을 13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고 환율 보상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다. 다만 이같은 수단은 임시적인 방편인 만큼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형마트도 환율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식품·수입과일 가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 미국산·호주산 소고기 수입 단가는 작년 대비 10%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아몬드는 생산량 감소와 환율 급등이 겹치면서 국내 수입단가가 약 3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대형마트는 마진을 최소화하고 프로모션을 실시해 수요를 촉진하는 전략을 우선 내걸고 있다.
이처럼 식품·유통업계 모두 고환율에 임시 방편으로나마 대응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의 경우 다양한 변동성을 전제로 공급망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환율 현상은 대처가 가능하다”며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업체의 체감 리스크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고환율 기조가 얼마나 장기화 되느냐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환율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식품·유통업계는 생산단가부터 마진까지 기존 사업 구조와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강달러가 야기한 수입 원가 상승은 소매 가격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최악의 경우 1500원대까지 갈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